요즘 한국문단은 젊은 여성작가들이 대세다. 이건 아마도 책을 사는 독자층이 젊은 여성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한국 소설은 시대에 따라 소재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60년대 작가들의 글에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 자주 등장했다. 사춘기의 내게 이런 작품들은 너무 어둡고 잔인했다. 그러다 만난 것이 최인호의 달달한 연애소설이었다. 얼마나 감미롭고 신선했던지.
그 후, 근대 산업화 시대에는 기업주와 노동자들의 갈등이, 서슬이 퍼렇던 군사독재가 끝난 후에는 이에 항거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문학의 소재로 등장했다. IMF 가 지나고, 성차별과 여성의 권익이 사회 전반에 공론화되며, 최근에는 여성의 삶을 그린 작품들이 많아진 것 같다.
81년에 한국을 떠난 내게 2000년대의 소재들은 다소 낯설게 느껴지며, 내 딸 나이의 여성 작가들이 쓰는 작품에서 나는 큰 공감을 느끼지 못한다. 자연스레 그들의 작품은 멀리하게 된다.
작가 ‘김애란’은 내가 좋아하는 몇 안 되는 여성작가 중 한 사람이다. 그녀가 쓴 산문집 ‘잊기 좋은 이름’을 읽었다.
대부분의 에세이 집은 1-2년 동안 잡지나 신문에 발표했던 글을 모으거나, 여행을 하며 쓴 글인 경우가 많다. 그녀의 산문집에는 2006-2017년 사이 10년 넘게 쓴 글들이 들어 있다. 아마도 그동안 쓴 글 중에서 선별해서 출판한 것이 아닌가 싶다.
아버지가 내 나이 또래인 1953년 생이므로, 그녀는 내게는 딸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으며 친근감을 느끼고 공감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글에 등장하는 그녀의 부모님 이야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녀가 대산대학문학상을 받던 날, 시상식에 왔던 어머니가 하는 말이다. “우리 친목회에선 배운 사람일수록 목소리를 크게 하고 발언을 많이 하는데 거기선 모두가 목소리를 삼분지 일만 내고서도 대단한 말들을 하더라… 앞으로 나도 목소리를 작게 내야겠다고 결심했다.” (현수막 휘날리며)
나도 젊어서는 어리석게도 목소리를 크게 내며 살았다. 관리 직원회의 때도 목소리를 높였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목청껏 핏대를 세우곤 했다. 어느 날엔가 목소리를 낮추니 일이 더 쉽게 풀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상을 받은 후, 아버지의 손에 끌려 중학교를 찾아가 교장 선생님을 만난다. 딸을 자랑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대목에서 나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했다. 신문에 실린 내 글을 읽은 성당의 교우에게서 인사를 받은 날은 신이 나서 내게 전화를 하곤 하셨다. 글이 나올 때가 되었는데 실리지 않으면, 왜 안 나오는가 묻는 전화가 오기도 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설거지를 하다 팟캐스트 방송을 듣게 된다. 책을 읽어주는 방송이었는데, 마침 그녀의 작품인 ‘성탄 특선’이 에피소드 목록에 들어 있었다. 바로 ‘꿈타장의 유혹하는 책 읽기’였다. 나도 한때 이 팟캐스트를 들었으며, 그녀가 말하는 이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한여름 밤의 라디오)
그녀의 부모님은 첫 소개팅을 하던 날, 주선한 사람 둘, 당사자 둘, 네 명의 젊은 남녀가 가게의 온돌방에서 뽕을 쳤다고 한다 찻집도 극장도 없는 시골이라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화투를 친 것이다. (카드놀이)
그 무렵 부모님이 먼저 미국에 가시고, 나는 동생들과 함께 살았다. 우리도 자주 뽕을 치곤 했다. TV는 아침과 저녁에만 방송을 했고, 핸드폰이나 인터넷은 상상도 못 하던 시절이다. 뽕은 쉽게 배울 수 있고, 여럿이 할 수 있다. 진 사람이 군것질 거리를 사 오곤 했었다.
‘창비’의 50주년 기념 기념 축하의 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지금 네가 있는 공간을, 그리고 네 앞에 있는 사람을 잘 봐 두라고. 조금 더 오래 보고, 조금 더 자세히 봐 두라고. 그 풍경은 앞으로 다시 못 볼 풍경이고, 곧 사라질 모습이니 눈과 마음에 잘 담아두라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생일 축하)
맞는 말이다. 세월은 물과 같아, 지금 내가 지나치는 시공간은 다시는 마주할 수 없다. 그러니 어찌 소중하지 않을쏘냐. 어떻게 내 딸아이 나이의 그녀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우리 어릴 적엔 겨울이면 애 어른 할 것 없이 담 아래 죽 앉다 햇볕을 쬐곤 했어요.” (그녀에게 휘파람)
나는 여름날 저녁 집 앞에 의자나 깔개를 놓고 앉아 부채질로 땀을 식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골목이 큰길과 만나는 모퉁이에는 꽈배기를 파는 구루마가 있었다. 학원이나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집에 가던 학생들이 나방처럼 카바이드 불빛을 보고 몰려들어 꽈배기를 사 먹었다. 그들의 까르르 하는 웃음과 재잘거림이 내게는 부러움이며 동경의 소리였다.
해가 지고 나면 전봇대에 달린 백열등에 불이 들어오고, 아이들은 그 주변에서 뛰고 놀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아빠에게 달려가곤 했다. 어떤 아빠는 붕어빵 봉지를, 어떤 아빠는 수박을, 그리고 어떤 아빠는 다음날 지어먹을 쌀 봉투를 들고 왔다.
그녀의 선배 작가가 겪은 벌레 이야기다. “사춘기 시절, 어머니를 여읜 뒤 쌀을 씻을 때 일이라고 한다… 쌀을 꺼냈는데, 그 속에 쌀벌레가 꿈틀대고 있었단다.” (그녀에게 휘파람)
외할머니가 맹장수술을 했을 때의 일이다. 중학생이었던 누나가 외가에 와 있었는데, 아침에 되자 누나는 학교에 가지 않고 쌀을 씻어 밥을 짓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내게 밥을 먹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다. 밥이 끓고 있는데, 어머니가 왔다. 어머니는 누나에게 칭찬 대신 야단을 쳐, 학교에 보냈다.
난 여름이면 벌레 난 쌀로 지은 밥에 익숙했다. 외할아버지는 가을이 되면 일 년 먹을 쌀을 사두는 것이야 말로 가장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믿는 분이었다. 봄이 되면 쌀에서는 벌레가 나왔다. 바구미가 나오고, 작은 나방이 나오고, 벌레 먹은 쌀은 쉽게 깨어진다. 우리는 여름내 반토막난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세월과 삶을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다. 70-8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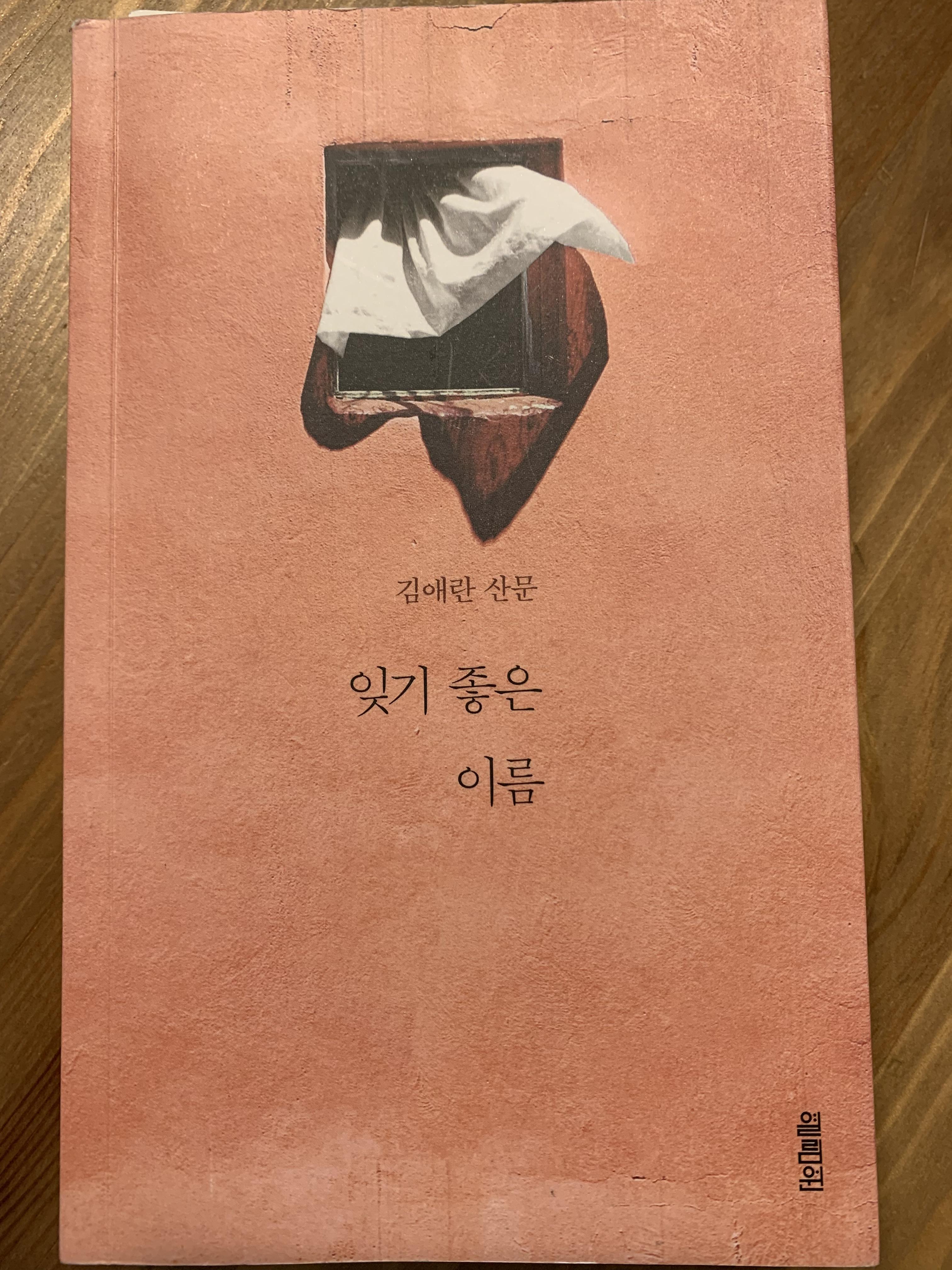
'책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불타는 말리부 (0) | 2021.09.01 |
|---|---|
| 일곱 해의 마지막 (0) | 2021.08.20 |
| 더 플롯 (The Plot) (0) | 2021.08.14 |
| 꽈배기의 맛 (0) | 2021.08.07 |
| 그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말 (0) | 2021.07.30 |



